네 번째 항암을 했다. 세긴 세더라! 독일 의사들 말이 빈 말은 아니었다. 항암을 받는 동안 얼마나 피곤하던지 내내 졸았다. 항암 후 열치료를 받을 때도 잤다. 그 후로도 계속 잤다.

네 번째 항암을 했다. 세긴 세더라! 독일 의사들 말이 빈 말은 아니었다. 그들은 늘 팩트만 말한다. 사족이 없다.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거다. 얼마나 센가요? 전보다 많이 센가요? 대답은 나도 안다. 네, 셉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하긴 했는데. 오후 늦게 마신 센 아메리카노 한 잔 때문에 망했다. 전날 잠을 설치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오후의 커피를 안 마셔야지. 마시더라도 에스프레소는 원샷만 넣어달라 해야지. 전날 밤부터 어깨와 목 통증도 있었다. 진통제를 한 알 먹었건만 계속 아팠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자 깜쪽같이 나았더라. 사랑한다, 진통제여.
다음날 아침 남편이 병원까지 데려다주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지하철 U반을 타고 한 코스. 트람을 타고 10분. 걸어서 10분. 서두른 덕분에 아침 8시 전에 도착. 언니는 새벽에 일어나 날 위해 해독 주스를, 항암 후 열치료 전에 먹을 현미 김밥과 미소 수프와 버섯 차도 텀블러에 담았다. 자른 사과와 바나나까지. 다행히 항암과 열치료 후에는 남편이 픽업을 왔다. 이날은 항암 후 나의 치과 진료와 아이의 스케일링 예약까지 있었다. 아이의 2주 방학 중에 치과 치료를 끝내려 했는데 이날 밖에 예약이 안 되어서. 나의 선샤인 샘이 치과에 근무하는 날이 수욜과 금욜 이틀뿐인 것도 이유였다. 금욜은 레겐스부르크의 힐더가드 어머니도 방문해야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난 또 왜 치과에? 주말에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10년 전에 때운 곳이 양치 중에 빠진 것. 치아에 구멍이 생겼으니 치료가 급했다. 화욜에 뼈 약물은 예정대로 맞았고. 치아에 진통은 없었기에.
그래서 항암은 어땠냐고? 항암을 받는 동안 얼마나 피곤하던지. 책장을 한 장도 못 넘긴 채 내내 졸았다. 3시간 반 동안. 자다가 화장실을 두 번 다녀온 기억밖에 없다. 비몽사몽으로. 언니가 기다리는 로비로 내려가서도 열치료 시간까지 테이블에 엎드려 잤다. 그 와중에도 입맛이 있나 없나 보려고 사과와 바나나를 먹었다. 입맛은 그대로였다. 자연요법센터로 가면서 병원 뒷길 숲 속 벤치에 앉아 김밥도 먹었다. 열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잤다. 그 후로도 계속 잤다. 치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집에 와서는 밥만 먹고 자정까지 죽은 듯이 잤다. 언니가 그 시간까지 내게 밥을 먹일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밥을 먹고 족욕을 하고 또 잤다. 이튿날 새벽 다섯 시까지. 그리고는? 생생하게 살아났다. 센 항암의 최대 부작용은 머리카락. 하룻만에 많이도 빠졌다. 가발 사는 걸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항암 다음날은 공휴일. 남편이 산책을 안 가냐고 아침부터 재촉한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이 망할 산책을 끝내리라. 뮌헨 동물원까지 왕복 1시간 30분을 걷고 왔다. 날씨는 화창하다 못해 더웠다. 낮 최고 기온 25도. 최근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림. 환자 아닌가. 좀 누웠다. 남편 또 등장하시고. 오후 산책은 안 가냐고 묻는다. 이번엔 같이 가주시겠다고. 이놈의 산책. 내가 가주고 만다. 1시간을 걷고 왔다. 1일 총 12킬로. 1만 8천보. 오는 길에는 레겐스부르크의 힐더가드 어머니께 안부 전화까지 끝냈다.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으려고. 조카가 비빔밥을 해준다기에. 그것도 돌솥으로. 조카는 1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 언니에게 요가를 배운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간다. 아름다운 품앗이 아닌가.
남편도 운동을 시작했다. 5월 마지막 주에 노천 수영장이 개장을 한 후로 수영을 다닌다. 걸어서 15분 거리. 남편도 뭘 해야 할 텐데 혼자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스스로 시작하다니. 기특하다. 애나 남편이나 그렇잖나. 잔소리 안 하면 안 되는. 요즘엔 잔소리하는 것도 일이고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편이다. 잔소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란 걸 알기에. 우리 언니의 음식 솜씨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삼시 세 끼를 죽어라 챙기는 바람에 살이 빠지기는커녕 항암 시작 이후 체중이 2킬로나 늘었다. 요즘 말로 이게 ‘머선’ 일인지 따져 물을 판이다. 의사는 살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언니는 말한다. 언제 입맛을 잃을지 모르니 입맛 있을 때 무조건 먹고 봐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만.
참, 치과 방문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해야겠다. 다행히 잠이 깨어 진료는 잘 받았다. 이런 시기에 치아에 문제가 생기다니 타이밍이 안 좋네요, 염려의 말부터 건네시던 나의 선샤인 치과 샘. 30분 만에 쓱싹쓱싹, 뚝딱뚝딱 구멍 난 곳을 메워주셨다. 그 시간에 아이는 옆방에서 스케일링 완료. 나도 아이 진료실로 따라가서 설명을 들었다. 치아 상태 양호. 양쪽 어금니 중 아래 어금니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축하할 일. 이제 치아교정을 시작해도 좋겠다 하시길래 샘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함. 아이의 치아가 눈부시게 새하얗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 마디로 괜찮다고. 치아색은 피부색과 같다며. 밝은 피부도 있고 어두운 피부도 있지 않냐고. 그 말을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웠다. 같은 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초록의 숲에서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 듯 항암의 피로마저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 작가: 뮌헨의 마리
뮌헨에 살며 글을 씁니다. 브런치북 <프롬 뮤니히><디어 뮤니히><뮌헨의 편지> 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마리 오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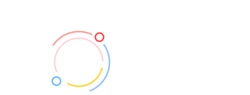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