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어느 날
‘독일에 사는 3년 간은, 그래, 아이를 마음껏 놀게 해 주는 거야.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면 공부에 파묻혀 살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다르게 살게 해주자.’라고 생각했던 초창기의 다짐이 흔들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학교 생활은 마치 유치원의 연장선처럼 공부와는 거리가 먼 스케줄(나의 기준에선!)들로 채워졌고, 아이는 매일 집과 학교, 가끔 친구의 집 등 장소만 달라질 뿐 하루 종일 놀고 놀고 또 놀았다. 한국에서도 저학년 때는 시험도 보지 않고 성적표에 등수도 매기지 않지만, 독일에선 한 차원 다르게 그저 ‘논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랄까, 분명 시간표엔 수학이라고 돼 있는데, 잉글리시라고 돼 있는데, 뭐 했는지 들어보면 결국 ‘놀았구나’ 하게 되는 식?
1학기는 적응기간이니까 2학기 되면 달라지겠거니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물론, 수학 시간에 카운팅(수 세기) 단위가 단 단위에서 십 단위로 올라섰고, 주별 1회 영어 단어 테스트-a, an, the 수준의-도 생겨났다. 한국 학년에 비하면 아주 낮은 레벨부터 그것도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는 식이었지만, 어차피 수업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여기선 학원도 사교육도 없으니 그 ‘느림’이 문제 될 게 없었다. 엄마들 만나면 학원 얘기, 교육 얘기에 열을 올리고, ‘누구네 집 아이가 어디까지 선행을 했네’ 하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도 없으니, 어쩌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한국 1학년들의 선행학습 실태’에 대해서만 무시하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병은 따로 있었다.

1학기가 끝나갈 즈음 친해진 미국 엄마는 첫 만남부터 대뜸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며? 한국 아이들은 똑똑한 거 같아. 집에서 어떻게 해?” 일단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똑똑한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아마도 내 생각엔 수학이었을 게다. 1학년에 입학하면서 하나, 둘, 셋을 세기 시작하는 여기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이는 한국 학년의 보편적 수준의 백 단위 천 단위의 카운팅과 두 자릿수 이상의 덧셈 뺄셈이 가능했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1학년 1학기를 마치는 시점에 담임 선생님이 써준 성적표에 수학 관련 코멘트가 ‘지니어스’였을까.
뭐 어쨌든, 내 아들이 똑똑하다고 말해주는데 기분 나쁜 부모가 어딨으랴. 당시만 해도 집에서 하는 거라곤 피아노 레슨과 영어책 읽기가 전부. 다행히 그리 긴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대충 ‘땡큐’하고 끝났지만, 그다음부터 미국 엄마와는 만날 때마다 공부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교육열이 강하다고 들었지만, 나는 독일에서 국적 다른 엄마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보통 이렇게 흘러갔다.
<상황 1>
나 : 너네 아들 요새 왜 이렇게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자주 가니?
미국 엄마 : 집에 오면 내가 숙제를 시키거든.
나 : 숙제? 무슨 숙제? 우리 숙제 없잖아!
미국 엄마 : 아, 내가 내주는 숙제야. 그거 하기 싫어서 학교에 더 오래 있으려고 하는 거 같아. 하하
나 : 그… 그렇구나.
<상황 2>
나 :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너네 아들이 9학년이나 10학년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대. 원래 3년 아니었어?
미국 엄마 : 그래? 왜 그렇게 말했지?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진 않을 거 같아.
나 : 응? 왜? 다른 나라로 또 발령날 수 있는 거야?
미국 엄마 : 그게 아니라, 아이는 여기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 미국은 공립학교 퀄리티가 별로야. 몇몇 좋은 학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사립 보내자니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마도 베를린에 있다가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나라에 가서 몇 년 더 살고 고등학교 때쯤 뉴욕으로 돌아갈 거 같아. 미국은 진짜 학비가 ‘크레이지’ 해. 넌 예정대로 가는 거야? 한국도 교육열 심하지 않아?
나 : 그렇지.. 그래도 가야지.
미국 엄마와 친한 싱가포르 아빠도 종종 우리 대화에 참여하곤 했다. 싱가포르도 교육하면 뒤지지 않는 나라인지라, 우리 셋이 모이면 역시나 대화는 각자 자기 나라의 교육에 대한 성토장이 되곤 했다.
<상황 3>
싱가포르 아빠 : 이번 여름방학에 싱가포르에 가서 아이를 학교 단기 코스에 집어넣었어. 여기랑은 비교가 안돼서 애가 엄청 힘들어하더라.
미국 엄마 : 그래, 싱가포르 교육열도 그렇지만 엄격하다고 들었어.
싱가포르 아빠 : 아이가 머리가 조금 긴 채로 갔더니 ‘너 여자야? 남자야? 머리 자르고 와’ 이러더라.
나 : 정말? 무슨 헤어스타일까지 지적을 해?
싱가포르 아빠 : 그러게 말이야.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
나 : 초등학생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지. 증고등학교 가면 규제가 있긴 해.
미국 엄마 :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교육에 관한 많이 비슷한 거 같아.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돼. 지니, 너는 한국 돌아가는 거 괜찮아?
나 : 돌아갈 생각 하면 걱정이 많지. 요즘 우리 애 또래면 보편적으로 선행학습 1년이고, 잘하는 애들은 2~3년씩 앞서서 한다는데, 여기선 따라갈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동안 그냥 잊고 지내려고.
미국 엄마 : 정말? 미국도 굉장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같아.

여기가 독일인지, 한국인지, 비슷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는 세 나라의 부모가 만나면 이렇게 늘 걱정 가득한 대화가 흘러갔다. 아마도 몰라서 그렇지, 다른 나라 부모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한 기술자로 살 수 있는(그렇다고 믿었던) 독일에서도 요즘은 학력 세습이니 부의 세습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며 교육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이역만리 땅에서 국적 다른 부모들과 니 내라 내 나라 할 거 없이 아이들 공부 얘기하고 있자니, 참 공부가 뭐라고!!
<오늘의 깨달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역시 부모가 문제다!
- 작가: 어나더씽킹 in Berlin/공중파 방송작가,종합매거진 피처 에디터, 경제매거진 기자, PR에이전시 콘텐츠 디렉터, 칼럼니스트, 자유기고가, 유럽통신원 활동 중, ‘운동화에 담긴 뉴발란스 이야기’ 저자
현재 베를린에 거주. 독일의 교육 방식을 접목해 초등생 남아를 키우며 아이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 본 글은 어나더씽킹 in Berlin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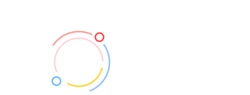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