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맛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쓴 인생, 굳이 쓰디 쓴 소주까지 마시며 상처에 소금을 끼얹을 필요는 뭐람. 나는 술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잘 못 마신다. (어쩌면 그래서 이슬의 맑은 단맛을 모를 수도 있다.) 소주는 입에도 못 대고 맥주도 기껏해야 한 병이 주량이다. 알코올만 들어가면 온 몸이 붉으락푸르락해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뻘개 지는 사람이 바로 나란 인간이다.
한껏 부푼 희망과 설레임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술 모임이 제일 싫었다. 선배들은 저녁이면 후배들을 불러보았다. 매일 밤 거나하게 취했고,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떠들었다. 사실 수다도 친구들끼리 해야 재미있지 윗사람과 함께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다. 게다가 선배랍시고 어지간히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마시다 보면 는다’(이제와 드는 생각이지만 이 말은 일종의 폭력이다.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내 주량을 늘려주겠다고 거들먹거렸다.(굳이 주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사코 거절하는 나 때문에 분위기는 갑분싸. 한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에서 한랭전선이 툭-치고 올라왔다. 그래 그렇다면 이 참에 한 번은 보여주자 싶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괴물이 되는지.
“선배가 정 원하시면 마셔는 볼게요.
대신 뒷감당은 못합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벌컥벌컥 소주를 병째 마셨다. 투명한 액체가 목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동시에 몸에서는 강력한 거부 반응이 역으로 치켜 올라왔다. 마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 핏기가 돌았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타는 소시지가 되었고 우웨웩-돌림노래를 수 십 번 부르며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다. 이 사건 이후로 선배는 나만큼은 술자리에서 ‘열외’해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체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열외를 운운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후로 술을 권하지 않게 됐으니 하룻밤의 희생치고는 꽤 괜찮은 보상이었다.
이게 뭐라고 일년 내내 목 빠져라 기다리게 만든다. 모름지기 흔하면 매력이 떨어진다. 독일 맥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개했을테니 과감히 생략하고, 알코올 취약계층이 추천하는 달달구리 와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리슬링Riesling
리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라라라라라라라~(음료수 광고 음악)
꽃을 사랑하는 꽃의 천사 루루~
뜬금없지만 나는 단어 중에서도 ㄹ을 편애한다. 혀에서 떨리는 어감이 근사하면서도 발랄하다. 고급스러움과 깨방정을 함께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이 좋다. 물론 발랄이라는 단어역시 ㄹ이 세 개나 들어가 있어서 아낀다.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슬링도 ㄹ이 각 글자에 공평하게 하나씩 세 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한다.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와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양보하자. 그렇지만 리슬링만큼은 독일이다. 옥토버페스트만큼 크지는 않지만 매년 봄이면 독일 지역 곳곳에서 와인 축제를 연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종이 리슬링이다. 특히 라인강이나 모젤강 유역이 리슬링 주산지로 유명한데 이 강 유역 근처 식당에서는 스테이크를 시켜도 포도가 딸려 나올 정도.


리슬링은 청포도를 주종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향이 다채롭고 당도에 따라 단맛과 드라이한 맛으로 나뉜다. 나처럼 술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이라면 Süss를 드라이한 맛을 즐긴다면 Trocken을 선택하면 된다. 리슬링의 청량함과 달콤함은 좀 오버해서 크리스탈 수정을 마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여기에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읊으며 오기택의 ‘청포도사랑’을 들으면 금상첨화다.
- 페더바이써(Federweißer)
페더바이써는 독일의 여름 끝자락과 초가을의 문턱에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한정판이다. 그해 첫 수확된 포도, 그러니까 숙성하기 전의 일명 Younger wine으로, 계속 발효 작업 중이기 때문에 기포가 퐁퐁 올라온다. 반드시 냉장보관 해야 하며 절대 병을 눕히면 안 된다. 같은 이유로 다른 주종과 달리 수출이 안 된다. 매우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각별하다.

적당한 달콤함이 일품이고 도수가 낮아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다. 아이스와인과 비슷하기도 하고 청포도 주스에 스파클링이 들어간 맛이랄까. 양파 케이크와 곁들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과일이나 피자 본인의 기호에 따라 안주는 마음대로.
매년 8월 중순이 되면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며 페더바이써를 홀짝인다. 일종의 여름을 보내는 나만의 의식이다. 한 여름밤의 꿈과같은 첫사랑, 청춘, 뜨거운 열기, 선선했던 여름밤을 달콤한 술을 마시며 보낸다. 엘리오의 마음을 따라가 본다. 페어바이써를 한 모금 머금는다. 그가 화답한다.
Right now there’s sorrow
지금의 그 슬픔
Pain
그 괴로움
Don’t kill it
모두 간직하렴
and with it the joy you’ve felt.
네가 느꼈던 기쁨과 함께
E la vita
인생이 그렇죠
- 글뤼바인(Glühwein)
크리스마스의 대명사 ‘글뤼바인(Glühwein)’. 뜨겁게 해서 마시는 레드 와인의 일종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체코, 핀란드 등 다른 유럽권 국가에서도 약간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술이다. 레몬이나 계피, 생강, 럼 등 마음대로 추가해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다. 글뤼바인에는 4~5%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알코올 들어간 것이 싫다면 Punsch)를 골라도 된다.


이 뜨거운 술은 “향기에 취해 있으면 혀의 감촉에 배신당하고, 맛에 취해 있으면 다시 향기가 다른 쾌락을 전해준다”고 했던 무라카미 류의 표현을 떠올리게 만든다. 보라색의 미묘한 빛이 마음에 착란을 불러 일으킨다. 자꾸 입술에 갖다대다보면 눈빛이 흐려진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몰아가면 작업주로는 최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글뤼바인을 마시는 재미가 쏠쏠한 것은 컵에 있다. 독일에서는 각 지역별로 도시를 상징하는 그림과 연도를 새긴 크리스마스 컵을 제작한다. 그 컵에다 글뤼바인을 따라 주는데 보통 글뤼바인이 2.5유로, 컵 보증금이 2,5유로다. 컵은 반납해서 2.5유로를 받아가도 되고 갖고 싶다면 그냥 가지면 된다. 물욕이 넘치는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 글뤼바인 컵을 어지간히 모았다.

4.내추럴 와인(Natural Wine)
보통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은 어울리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내츄럴 와인은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린다. 뭐랄까.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추럴 와인은 흔히 우리가 힙하다고 말하는 독일의 젊은이들을 닮았다.

애주가는 아니지만 봄이면 리슬링을 여름이면 페더바이써를 겨울이면 글뤼바인을 꼭 챙겨 마셨다. 이들은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리슬링은 옅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가는 한 떨기 벚꽃을, 페더바이서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나뭇잎을, 글뤼바인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기백있게 매달려 있는 백당열매를 마시는 것만 같았다. 사시사철 다른 와인을 맞이하며,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다는 호젓함에 빠져들곤 했다. 온 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달디 단 술을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을 예찬하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따갑던 햇살이 따뜻함으로 변모하는 여름의 끝자락이다. 바야흐로 페더바이써를 한 잔기울이며 ‘콜 미 바이유어 네임’ OST를 듣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이 근사한 순간을 예찬하며 건배한다.
E la vita 인생이 그렇죠. 작가: 여행생활자KAI
독일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는 여행생활자, 주변 살펴보기가 취미인 일상관찰자
본 글은 여행생활자KAI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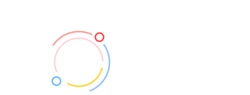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