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Fernweh : longing for distant places, 지난겨울부터 올해 봄을 거쳐 6개월 이상 락다운 기간을 거치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독일어다. ‘weh’라는 표현은 ‘pain’이다. 집 밖으로 멀리 나가고 싶어 생기는 고통, 지금도 진행 중인 아픔.
문이 열린 틈을 타 잠시 떠났고, 잘 돌아왔다.
새로운 것을 보고 눈이 호강했지만, 시각이 받아들인 무수한 정보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단한 시련은 없었지만, 순간순간 해결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블로그와 유튜브들의 자료를 보며 나의 경험 위에 다른 이들의 경험을 얹어 버무리며 다시 정리해보는 중이다.


왜 떠날까.
산적한 현재의 문제들을 제쳐두며 ‘망각의 자유’를 얻는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내내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겪어내는 보람이 있다. 모든 숙박 예약을 미리 완벽히 해놓기는 커녕, 하루 전날 혹은 당일 숙소를 지정하며 당장 내일 갈 곳을 닥쳐서 고민하거나 수정하는 긴장감을 즐긴다. 긴장감, 임시성, 즉각성, 융통성, 해내고 나서 얻는 쾌감이나 다행감, 우리 가족도 해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
집에서는 해야 할 일 투성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집안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아이들의 학업 플랜을 짠다. 나와서는 좀 가벼워지고 싶다. 너무 많은 계획을 짜면 기대감이 커지고, 그럼 여행조차도 자유가 아닌 구속과 압박으로 변질된다. 융통성 있는 순조로움을 경험하고 싶고, 계획을 짜는데 든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가성비 높은 자유를 원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초조했던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계기로도 삼고 싶다.
나가는 김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명확히 추구하거나 꼭 바라는 것은 없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만의 특별한 갤러리를 가야겠다는 정도? 그보다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과 깨달음을 바란다.


여행이 진행되면서, 내 취향과 색채를 더 분명히 짚어가는 기쁨이 있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하이킹과 박물관 유랑 둘 중에 이것이 좋다며 날카로운 선을 긋지는 못한다. 그레이 존에서 방황한다. 도시의 잘 정돈된 갤러리와 예쁜 가게들을 둘러보다가도 인파에 지칠 무렵, 산 안개가 내려앉은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 진다.
여행은 쉼과 배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둘 중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쉽지 않다. 쉬는 와중에도 뭔가를 얻고 배우길 원한다. 찍어온 여행 사진들 중엔 작품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문을 찍어온 것도 많다. 언제 다시 뜯어볼지 기약 없는 숙제거리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라도 더 얻어야 한다는, 촌스럽고 고루한 모범생 같은 버릇은 쉽게 어딜 가지 않는다. 편하게 쓱 둘러보는 배우자 스타일과 공부하듯 뜯어보는 내 스타일의 차이도 확인한다. 한 사람은 이미 다 보고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 기다려준다.


여행지의 시간은 현실 세계 시간과 다르게 더디게 흐른다. 이미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고작 3일이 지났다. 더 열심히 보고 치열하게 다녀서 그런가, 하루가 여러 날의 하루로 나뉜 걸 겪어낸다.
여행 중반에 접어들면 여흥과 여독 사이에서 조마조마한다. 무더위가 없는 집에서 편히 먹고 자고 깔끔하게 지낼 거 뭣하러 땀과 먼지로 도배하며 빨랫감과 아이들을 이끌고 매일 다른 숙박지로 이동하고 있는지, 여행지 밖의 관점으로 따져보기도 한다. 그러다 고생(?)에 상응하는 뭔가를 꼭 얻어야겠다는 강박이 더 채찍질을 하기도, 좀 비워가며 쉬엄쉬엄 내버려 두기도 한다.


사전 리뷰와 블로그 사진으로 접했던 풍경과 이질적인 모습에 실망도 많이 한다. 예뻐 보이는 거리 뒤에 내팽개쳐진 밀라노 시내의 더러운 화장실에 충격을 받았었다. 다듬은 사각 프레임에 담긴 단면과 그 아래 펼쳐지는 연속적인 실상은 다르다. 예초에 기대와 환상을 버리는 방법도 있고, 나만의 필터를 장착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다. 어찌 됐든 많이 보고 겪고 나면 사람은 바뀐다. 닳거나 유들유들해지거나, 융통성도 생기고 더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여행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여행의 시작은 현재 있는 곳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한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머릿속이 엉켜있고, 의무의 고통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여행은 시작된다. 해야 될 일을 잠시 잊고, 세 끼를 만들 필요도 없고, 설거지와 청소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유다.

차멀미를 겪으며, 오아시스 환시를 경험하면서도 울퉁불퉁한 토스카나의 국도에 올라탄다. 벨트를 하고 멀미약을 마시며 눈을 감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무엇 때문에 여행을 시작했는가. 무엇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차멀미에서 시작되어 진행하는 편두통이 여행의 현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다른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중에서

- 작가: 익명의 브레인 닥터 / 의사
말보다 글로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13년 차 신경과 의사입니다. 우연히 코로나 시대의 독일을 겪는 중입니다.
- 본 글은 익명의 브레인 닥터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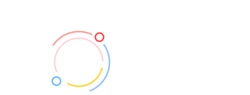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