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베를린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다.
흐린 하늘과 갑자기 쏟아지는 눈 아니면 우박. 예상치 못한 소나기와 매서운 바람. 현재 베를린은 지독한 4월의 날씨(Aprilwetter: 아프릴 베터, 변덕스러운 4월의 날씨를 상징적으로 칭하는 말)가 한창이다. 3월 반짝 따뜻한 기운 속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겨우 돋아난 자그마한 새순들이 꽃을 피워내기도 전에, 혹은 애써 꽃을 피워낸 이 시점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처럼 왔다가는 4월의 지금이 아직도 낯선 탓에 괜히 두꺼운 외투 깃을 세워 종종걸음을 걸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꽃을 피워냈다.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게들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지만 꽃집들은 절대 문을 닫지 않았다. 아니, 닫지 못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관과 향기를 지닌 다양한 식물들을 곁에 두기 원했던 것 같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봄이 되었다. 봄에 피어난 꽃들은 다른 계절의 꽃보다 유난히 생명력이 넘친다. 꽃잎이 피워내는 색은 그 채도가 남다르다. 특히 이 무렵에 만나는 튤립은 봄의 기운을 한껏 품은 화려함으로 무장한 채, 꽃집이나 마트 한편을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다. 나도 어느 일요일 오전, 지하철 역 꽃집에서 튤립 한 다발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투박한 종이 포장 속 분홍빛 튤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
튤립을 보면 늘, 베를린에서 맞이했던 첫 봄이 떠오른다.낯설기만 하고 두렵기만 했던 타지에서의 시작점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해야 할 일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저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전혀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 나가고 있었나 보다. 그런 내게 어느 날, 이미 베를린에 오래 살고 있던 친한 동생이 튤립 한 다발을 불쑥 내밀었다. 당장 튤립들을 꽂을 꽃병 하나 조차 없던 나는, 누군가에게 얻은 기다란 유리컵에 물을 담아 급하게 튤립 열 송이를 무심히 꽂아두었다. 그 날, 의도치 않게 우리 집에 찾아온 튤립 열 송이는 흑백 사진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며 ‘생기’라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집안일을 하다가 한 번, 독일어 공부를 하다가 두 번, 무심결에 세 번. 작디작은 튤립 봉오리가 나의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이유모를 에너지로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튤립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좋아졌다. 매일 아침 유리컵의 물을 갈아주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었다. 비록 일주일 후에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튤립 꽃봉오리를 잘 추슬러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했지만 나에게 그 경험은 무척이나 새로웠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 특별한 경험 이후로 나는 종종 꽃다발을 사기 시작했다. 나에게 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한 낱 소모품 따위가 아니었다. 깜깜한 어둠 속을 고작 작은 촛불 하나가 환히 밝히듯, 작은 꽃 한 송이는 어둡고 메말랐던 나의 마음을 한 순간에 환히 밝혀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편에 분홍빛 튤립을 올려두었다.베를린의 잔뜩 찌푸린 회색빛 하늘도,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도, 굵은 눈 줄기 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우리 집만큼은 진짜 봄이 찾아왔다. 따뜻하고 포근한 봄의 기운이 내려앉았다. 분홍빛 봄이 오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딸아이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튤립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연신 손뼉을 쳐댔다.
돌이켜 보면 이십 대 혈기 왕성하던 그 시절에는 한없이 높았던 감정의 역치 값으로 인해 어지간한 자극에도 쉬이 반응하지 못했다. 소소한 것이 무엇인지, 일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어 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는 누군가가 건넨 장미꽃 한 송이, 꽃 한 다발은 그저 관리하기 귀찮은 쓸데없는 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은 감정의 역치 값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밸런타인데이에 남편이 사 온 빨간 장미 한 송이에도 속이 간질간질하고 딸아이가 잔디밭에서 따온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는 것처럼.
앞만 보기보단 쓸데없이 옆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그 순간의 틈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인간다움이 생겨난다. 따스한 봄이 찾아와도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당장 해결하지 못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거나 혹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거나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른 채 무작정 깜깜한 세상을 헤매고 있다면 잠시, 정말 잠시만 멈추어 서서 옆을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따스한 봄이 곁에 서서 우릴 향해 손짓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집안 어딘가에 놓아두는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의 소박하지만 찬란한 존재로 인해 누군가의 얼어있는 마음 위로 가만히 내려앉을 봄을 상상해본다.
- 작가: KIRIMI/KiRiMi 일러스트레이터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삶 –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득 영감을 받아 무작정 기록해보는 진솔한 이야기.
- 본 글은 KIRIMI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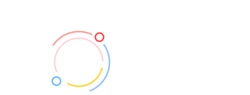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