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암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이와 웃을 것이다, 이렇게!
암은 춥고 심각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겠지? 내 전략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얘들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할 작정이다. 그중에는 웃음도 있다.
낮 12시를 사랑하게 되었다. 오전 산책이 끝나는 시간.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는 않았다.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나갔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어떤 날은 오전만, 어떤 날은 둘 다, 어떤 날은 이자르 강변으로, 어떤 날은 경사길 공원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마트에도 들른다. 계란과 과일과 야채를 사들고. 집에 오면 낮 12시. 얼마나 달콤한지. 오후 산책 때까지 내 손에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 하루 종일 나만의 시간 아닌 게 어딨냐마는. 산책 전에 미역국과 잡곡밥을 먹는다. 배는 고프지 않다. 차 한 잔과 귤 몇 개와 책 한 권. (웃기지 말라고? 아직 수술을 안 받아서 이런 배부른 소리가 나온다고? 그럼 어쩌라고! 허구한 날 징징 짜고 있으란 말인가.)
직행하는 곳은 부엌도 침대도 아닌 거실의 벽난로식 가스 오븐 앞. 진짜 벽난로는 아니지만 장작 모양 불꽃이 타고 있어 효과 만점이다. 따듯하기도 하고. 장작 타는 효과음까지 제대로 난다. 이 정도면 라디에이터와는 비교 불가다. 누군가의 조언대로 체온 1도 올리기를 연구 중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 부엌 아궁이가 떠오르는 거다. 특히 나는 자궁 쪽이 약하니 타깃도 제대로다. 우리 세대면 대충 알지 않나.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으면 그게 바로 핫 온열치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가스 오븐 앞에 의자를 들고 와서 앉는다.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 아궁이만 하겠냐마는. (뭐 어때! 급한데 찬밥 더운밥 가릴 때인가.)
병원에 간 날로부터 1주일에 2킬로를 뺐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밥이 잘 넘어갈 리가 있나. 하지만 밥은 잘 넘어갔고, 그러니까 저절로 빠진 게 아니라 노력해서 뺀 살이란 뜻이다.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환호성을 질렀다. 저렇게 좋을까. 진작 말하지. 우리 언니의 조언도 따라볼 생각이다. 차만으로 몸을 데우기는 쉽지 않으니 탕처럼 끓여마시라는 거다. 도라지나 대추 같은 건 몰라도, 오렌지나 자몽이나 석류나 사과나 배나 생강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차처럼 끓여 마셔보라는데. 그런데 너무 시면 어쩌지? 빅투알리엔 마켓이나 터키 상회에 가면 대추가 있을지도. 대추 대신 무화과는? (아, 이 무한한 순발력과 두뇌 회전력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지난주에 남편은 사흘간 출장을 갔다. 아내가 병을 선고받는다고 남편이 출장을 못 가란 법은 없다. 남편은 수요일에 병원에 전화를 했고, 여의사는 결과는 안 나와도 수술과 치료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아우트 라인을 고민하겠노라 했다.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아내에게 성실한 보고도 잊지 않았다. 말만 들어도 고마웠다. 한 사람의 이방인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의료팀이라니.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나는 항상 운이 좋았다. 이번에도 그 운이 어디 가겠나! (그게 내가 유일하게 믿는 구석이다.) D-day는 금요일이었다. 이번에는 남자 의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벌써 한국에 간 줄 아시더라고. 안 갔다고 했더니 놀라시더라, 남편이 전했다. 그럼 바로 플랜에 들어가자고. 결과를 내게 직접 말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덧붙이셨단다. 난 정 반댄데.
나는 최근 다른 일로 마음이 바쁘다. 수술도 체력전인데. 첫 자궁근종 절개 수술을 받을 때는 강철 체력을 자랑하던 30대 후반이었다. 상해에 살 때였다. 수술 후 금방 회복했다. 걷지도 움직이지도 말고 조심하라 했지만 그냥 걸어 다녔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시험관. 마흔에 시험관을 준비할 때였다. 1년 동안 체력을 키웠다. 아침 저녁으로 나 홀로 가파른 언덕길을 산책했고, 오전에는 집에서 108배를, 오후에는 남편과 헬스장에서 개인 피티를 붙였다. 힘든 줄도 모르고 단번에 성공했다. 그때도 모든 과정을 혼자서 했다. 오십이 되었다. 이번에는 암이란다. 강력한 한 방이다. 여기는 독일. 갱년기에 비축한 체력은 없고 시간도 없다. 몸도 못 풀고 본 게임에 투입되는 운동선수 비슷한 심정이다. 어쩌랴, 상대는 강하고. 하다 하다 멘털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도 오는구나.
결론만 말하자면 나는 암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싸우긴 왜 싸우나. 내가 바본가. 질 게 뻔한 싸움을 걸게. 이럴 때일수록 잔머리를 굴려야 한다. 암은 축축하고 심각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겠지? 내 전략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얘들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할 작정이다. 그중에는 웃음도 있다. 주말 저녁에 아이와 폰으로 《응답하라 1988》 하이라이트 편을 보았다. 그것도 밤 12시까지. 요즘 진짜 12시와 친하다. 밤낮없이.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하던 시절이 저 때겠다. 유튜브라 1~2분마다 광고가 들어왔다. 이야기의 흐름은 끊겼다. 그래도 좋았다. 매번 낄낄거렸다. 아이도 처음에는 엄마의 올드한 드라마 취향을 힘들어하더니 금방 적응했다. 저 때 니 지호 삼촌이 태어났잖아. 저 때 엄마가 대학생이었잖아! 아이는 하나도 귀담아 안 듣더라. 그건 그렇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 수술이고 뭐고 빨리빨리 해치우고 현경이네 가서 3박 4일 《응답하라 1988》 풀버전을 보는 것이다. 아이도 같이. 현경이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조르면서.
 빅투알리엔 마켓 옆 토탈 이태리 마트 <이탈리>에서 발견한 홍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편단심 감순이였다.
빅투알리엔 마켓 옆 토탈 이태리 마트 <이탈리>에서 발견한 홍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편단심 감순이였다.
작가: 마리 오
뮌헨에 살며 글을 씁니다. 브런치북 <프롬 뮤니히><디어 뮤니히><뮌헨의 편지> 등이 있습니다.
본 글은 마리 오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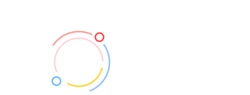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