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7일. 빅투알리엔 마켓.
나는 이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남편의 새어머니이자 나의 시어머니인 힐더가드로부터 당신이 ‘알츠하이머’라는 폭탄선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내게 남기신 가장 최근의 알츠하이머 흔적은 이렇다. 어머니는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셨다. 월요일 아침 택시로 어머니의 발 전문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고. 그날은 나 역시 바빴다. 암센터에서 피검사를 했고, 뼈주사도 맞았다. 그날따라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머니는 예상보다 빨리 마치셨다. 뮌헨 시내에서 쇼핑이라도 하며 기다릴 테니 당신 걱정은 말라하셨다. 트람과 지하철 우반을 갈아타고 뮌헨 시청사 앞 마리엔 플라츠에 도착하셨다는 왓츠앱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나 흐른 걸 보면 찾아가느라 애를 먹으신 게 틀림없었다. 30분이면 되는데 1시간이나 걸리셨다.
내가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를 눈치챈 건 2년쯤 전이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한 마디로 완벽한 분이다. 내게는 그랬다. 20년도 넘게. 집도 반짝, 패션 감각도 남달랐고.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환하시고, 거기다 재테크까지 잘하셨다. 시아버지 일 때문에 뉴욕에도 오래 사셔서 지금도 영어회화반에 다니신다. 그 연세에. (2021년 올해 만으로 76세시다! 독일에서 60~70대는 젊은 노인층에 속한다. 80~90대는 되어야 제대로 노인 축에 든다.) 젊은 시절 10년 정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신 적도 있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도 아직도 세금 정산을 직접 하신다. 요즘 들어 부쩍 힘들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 오래 하시지는 못할 것 같다.
어머니와는 월요일 점심시간 빅투알리엔 마켓에서 만났다. 눈도 좋으시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찾아내시고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닌가. 나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점심을 어디서 먹나 고민하며, 단골 베트남 식당이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알아볼 생각으로 분주히 걷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발 전문의를 만난 경과부터 확인. 의사가 그러더란다. 수술은 권하고 싶지 않다고. 그 의사 참 마음에 들더라. 어머니의 총평이었다. 보통 수술을 권하기가 쉽지 안 권하기가 쉽냐며. 수술이 돈이 되는 건 세상 어디나 똑같은 모양이다. 수술을 하면 3개월 동안 꼼짝도 않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했단다. 그게 가능한가. 어머니는 혼자신데.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쳐도 그동안 살만 찌고, 체중은 늘고, 근육은 빠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길어야 10년이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뮌헨의 빅투알리엔 마켓에 서서, 눈부신 푸른 하늘과 빛나는 가을 햇살을 머리에 인 채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폭탄선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진심에서 나온 말씀이란 걸 눈치챘다. 아,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이럴 때 감정이 넘치는 과도한 반응은 금물이다. 당사자는 결코 그런 리액션을 바라지 않는다. 그건 내가 암에 걸려봐서 안다.
“나, 알츠하이머야.”
“아,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깜빡하는 건 너도 알지? 내가 발가락 수술도 했잖니. 그런데 그 의사 이름을 물으면 기억이 안 나. 이게 말이 되니?”
“주치의와는 상담해 보셨고요?”
“다 소용없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니. 하네스를 봤잖아. 약도 없다. 지금처럼 활동적으로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
그건 맞는 말씀일 것이다. 시아버지 하네스는 알츠하이머로 5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 시아버지를 집에서 5년간 모신 것도 어머니였으니 누구보다 알츠하이머의 처음과 끝을 꿰고 계실 것이다. 내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위로란 없었다.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점심이나 먹어요!”
“그러자꾸나. 난 커피랑 플럼 쿠헨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간단히 먹어야겠다.”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던 내가 볶음밥의 일종인 나시고랭을, 어머니는 스프링롤로 주문 끝. 문제는 라이스페이퍼가 어머니 입에 안 맞았다는 것. 하나를 소스에 찍어 드신 후에는 더 드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난 나시고랭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머니는 하나 남은 스프링롤을 싸가라고 하셨지만 난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자고로 남은 음식은 싸가는 순간 맛이 떨어지는 법. 어머니는 맛있게 먹는 날 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며느리의 먹성은 알고 계신 지 오래. 점심 식사 후에는 어머니와 뮌헨 중앙역까지 함께 걸었다. 뮌헨 역에서는 기차 출발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아서 어머니와 차도 마시고 마지막에는 따뜻한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그날 저녁 8시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였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너, 그 스프링롤은 집에 가져가서 잘 먹었니?”
에구머니나, 어머니의 기억 속 스프링롤이 우리 집까지 따라왔구나. 확실한 건 내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럴 땐 모른 척하고 유쾌하게 맞장구를 치는 수밖에.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죠!”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아이에겐 눈을 찡긋하며 사인을 보냈다. 요즘 어머니는 전날 하셨던 말씀을 다음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남편도 아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어딘가.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오긴 하겠지만. 뮌헨 역에서는 어머니를 태운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플랫폼에 서서 바라보았다. 기차의 이름은 알렉스 Alex. 뮌헨을 출발, 레겐스부르크를 거쳐 프라하까지 간다. 알렉스, 우리 어머니 레겐스부르크까지 잘 부탁해. 그리고 어머니께 왓쯔 앱을 썼다.
“우린 아직 어머니가 필요해요. 아시죠? 우리 가족은 셋이 아니라 넷이라는 거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어머니를 사랑한답니다. 그것도 많이요. 아주 많이요…”
첫 문장은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난 울었지. 사랑은 이렇게 쉼 없이 오고 간다. 다정하고 따스하게. 독일로 오길 정말 잘했다. 4년 전의 결정이 신의 한 수였다. 아무도 없는 곳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둘 수는 없지. 항암이 끝나면 매주 어머니를 뵈러 갈 생각이다. 소풍을 가듯 기차를 타고. 어머니와 맛있는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참, 지난주 항암은 쉬었다.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무조건 쉬라고 해서. 덕분에 이번 주엔 호중구 주사도 안 맞고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단 한 번 남았다. 마지막 항암은 기필코 무사히 끝내야 한다. 나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 작가: 뮌헨의 마리
뮌헨에 살며 글을 씁니다. 브런치북 <프롬 뮤니히><디어 뮤니히><뮌헨의 편지> 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마리 오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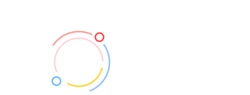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