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어느 날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베를린 생활은 여전히 새로움의 연속이다. 완전히 익숙해지려는 순간에 꼭 터지는 당황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또 발생했다. 2018년 10월 초, 연간 전기세를 정산하며 적지 않은 추가 금액에 속이 쓰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 것.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관리비다. 상황 설명을 위해 독일의 관리비 시스템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독일의 임대료는 순수 월세에 ‘네벤코스텐’이라 불리는 관리비를 더해 책정된다. 이 관리비에는 각 세대의 개별 난방비와 수도세를 포함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엘리베이터 이용료, 청소비용, 쓰레기 분리수거비용, 기타 아파트 유지와 관리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난방비와 수도세가 별도가 아닌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것만 제외하면 한국의 관리비 구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미리’ 짐작해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9월에 입주하면서 ‘정해진’ 관리비는 비슷한 세대의 그것을 토대로 ‘짐작된’ 금액인 셈이다. 때문에 실제 사용량과 낸 금액 사이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차이 부분을 일 년치 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비용 발생 후 청구되는 시스템이니, 매달 청구된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끝이지만, 이곳에선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일 년 정산 내역이 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비를 돌려받은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터라, 입주 후 나는 각별히 ‘신경 쓰면서’ 살았다. 특히 난방비가 ‘주범’이라는 말에 한겨울에도 난방은 기본으로만 하면서 집안에서조차 오리털 조끼를 입고 생활했다. 각 방과 거실, 주방, 욕실 등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온도조절장치는 꼭 필요한 곳만 난방 온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아예 꺼두기까지 했다. 매달 350유로, 한국 돈으로 4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여기서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흐짤룽’이라고 하는 일 년치 정산된 관리비 내역은 보통 이듬해 5월쯤 청구된다고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 이듬해 5월이 지나도 나흐짤룽은 날아오지 않았다. 만 1년을 채우지 않아 그런가 싶어 하우스 마이스터(집 관리인)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만 같아 관두기로 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그것도 연말이 다 된 시점에, 2017년 관리비 내역서가 우편함에 떡 하니 들어있는 게 아닌가. 봉투 겉면에 예쁜 초콜릿 장식을 단 채 발신인이 ‘하우스 마이스터’로 된 우편물을 보고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히들 주고받는 카드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안에 든 서류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의 난방비와 온수 등 물 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청소비 등 공동 관리비 지출 내역이 여러 장에 걸쳐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추가로 50유로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국인 친구는 “나는 500유로를 추가로 낸 적도 있다”며 위로했지만, 4개월치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걸 기준으로 연간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2018년도 나흐짤룽은 150유로 어쩌면 그 이상이 추가 청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쓰렸다. 지난 5월에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아끼며 살았을 텐데, 왜 2018년이 다 지나가는 마당에 전년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어쩌랴. 2019년만이라도 관리비 폭탄을 피해 갈 궁리를 할 수밖에. 세부 항목을 보니 온수 사용료는 우리가 이미 낸 금액보다 실제 사용료가 훨씬 컸고, 엘리베이터 이용료 등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돼 있었다. ‘춥게’ 산 덕에 난방비는 그럭저럭 선방했지만 온수가 문제였던 것. 돌이켜보니 식기세척기보다 손 설거지를 자주 하면서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나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고, 머리를 감고 샤워하는 등 씻는 방법에서도 사소한 온수 낭비가 발생하는 것 같았다.
당장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설거지는 가능한 모아서 하루에 한 번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것으로 바꿨고, 씻을 때도 물 낭비가 없도록 온 식구가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 중이다. 500유로를 추가로 냈었다는 친구가 올 겨울 내내 난방을 전혀 안 하고 지내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최소한 기본만 유지하는 난방조차도 더 줄이거나 꺼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한국에선 한겨울에도 집안에서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지냈는데, 독일 생활은 거의 반 강제적으로 절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 이 습관 그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부자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뭔지.
<오늘의 깨달음>
이렇게 난방을 하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 있다니! 의지보다 무서운 게 돈인가?
- 작가: 어나더씽킹 in Berlin/공중파 방송작가,종합매거진 피처 에디터, 경제매거진 기자, PR에이전시 콘텐츠 디렉터, 칼럼니스트, 자유기고가, 유럽통신원 활동 중, ‘운동화에 담긴 뉴발란스 이야기’ 저자
현재 베를린에 거주. 독일의 교육 방식을 접목해 초등생 남아를 키우며 아이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 본 글은 어나더씽킹 in Berlin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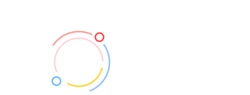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