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지하철 (U-Bahn, 우반)을 한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베를린 중심부에서 조금은 떨어진 외곽이었다. 그리고 3층짜리 단독주택의 아름다운 식탁에서 맞이한 브런치의 모습은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나는 자연스럽게 딱딱한 빵 한 개를 내 접시로 가지고 왔다. 그것을 반으로 가른 후 다양한 치즈와 햄들을 얹어 입 쪽으로 가지고 갔다.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한 빵의 풍미와 진하면서도 담백한 치즈 그리고 탱글 하면서 전혀 느끼하지 않은 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입 안을 풍성하고 가득하게 채워주었다. 폭신한 크로와상을 보고도, 투박한 빵을 향해 손을 뻗는 나의 모습이 꽤나 새삼스러운 순간이었다.
처음 베를린에 왔을 때, 집 근처엔 빵을 파는 가게가 참 많았다. 아쉽게도 전통적인 빵가게보다는 프랜차이즈 느낌의 가게들이 즐비했지만, 그곳에 파는 빵은 하나같이 투박했고 볼품이 없었다. 가장 저렴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흰색 타원형의 손크기만 한 작은 빵이 있었다. 그 빵은 브로췐(Broetchen,. 작은 빵)이라고 불렸다. 가끔은 슈리페(Schrippe)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그나마 맛있어 보이는 빵들을 하나둘씩 사보기도 했다. 대부분의 빵들의 겉은 딱딱하고 속은 쫄깃한 느낌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한국에 파는 여느 빵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해바라기 씨앗이나 호박 씨앗이 박혀있는 빵, 양귀비 씨앗이 박혀있는 빵도 사보았다. 품에 가득 찰 법한 묵직한 빵도 사보고 프레츨도 사보았다. 심지어 빵들은 그 크기가 클수록 보관 하기도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며칠을 방치하면 금세 딱딱하게 굳어버려 칼로도 썰어지지 않는 돌덩이가 되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모카빵, 밤식빵, 달고 노란 크림이 속에 꽉 찬 크림빵들이 어지간히 그리웠다.
두 번째 관문은 치즈와 햄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었다. 전혀 독일어를 모르던 시절, 사전 하나 들고 마트로 갔던 기억이 난다. 수 십 가지의 치즈 앞에 서서 하나하나 사전으로 검색해 보았다. 7년 전에는 베를린의 여느 거리나 가게 안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으로 열심히 찾은 단어는 ‘신선한’ 내지는 ‘치즈 조각’ 정도였다. – 죄다 치즈를 꾸미고 있는 형용사들만 찾고 있었다.- 치즈 자체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닐뿐더러 한국말로 번역된 정보를 읽어봐도 무슨 맛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치즈들을 실험하듯 사보았다. 가끔은 성공했고 가끔은 실패했다.
햄과 소시지는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생소한 모양과 종류들의 햄과 소시지가 마트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번은 송아지의 간으로 만든 소시지(Leberwurst, 레버 부어스트)를 사서 구워 먹으려다 낭패를 본 적도 있었다. 프라이팬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힘없이 부서져버리는 햄이라니! 나중에 알고 보니 생으로 빵 위에 발라먹을 수 있는 소시지였다. 하지만 그때는 으스러지는 소시지를 프라이팬 위에서 겨우 겨우 긁어모아 구워 먹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웃음이 피식 난다.
수 십 혹은 수 백가지의 소위 ‘반찬’ 같은 역할을 하는 치즈, 햄, 소시지, 크림치즈, 잼 등이 한 마트 당 기본적으로 두 세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마트 종류가 적어도 수십여 개가 있으니 아직까지 입에 가져가 보지 못한 것들이 먹어본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육점처럼 전문적으로 치즈와 햄을 파는 코너나 가게가 있고 가끔은 길거리 장이 열리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곳에서 원하는 종류로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만큼의 내공을 쌓지 못했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실험을 하기에는 항상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를린의 카페에서 브런치를 주문하면 적당한 두께로 잘려 나오는 딱딱한 빵이나 작고 동그란 빵들이 다양한 치즈, 햄, 야채, 계란 프라이 및 스크램블 등과 함께 나온다. 슈툴레(Stulle)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형식의 빵들도 쉽게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재료들이 고유의 맛을 최대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스가 가미되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페스토(pesto) 약간 혹은 올리브 오일이나 소금이 전부다. 있는 그대로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고자 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여기서 독일식 빵들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빵 자체에 그렇다 하는 맛이 없고, 부드럽지도 않다. 심지어 첫 입에는 투박하다 못해 혀를 겉도는 낯섦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곱씹을 수밖에 없으며, 저작 활동이 빈번해질수록 고소하며 담백하다. 이러한 빵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재료들의 맛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무궁무진한 맛을 펼쳐 낼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위에 혹은 그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오든지 간에 거뜬히 끌어안고 조화롭게 풀어낸다.
웃기지도 않게 지금은 부드럽고 살살 녹는 빵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다. 부드러운 생크림이 가득 올려진 폭신한 케이크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람의 입맛은 참 간사하기 그지없다. 친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다른 빵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값비싼 빵보다, 그렇다 할 모양새도 없이 저렴하기까지 한 독일식 빵이 참 좋다. 단독으로 먹어도 별의별 맛이 다 느껴지는 화려한 빵보다, 다른 재료 들과 곁들일 때 진가를 발휘하는 독일식 빵이 참 매력적이다.
생각만큼 부드럽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가 보다. 그것이 빵이든, 사람이든, 사회든 간에- 이제는 나 혼자 잘난 맛에 떠드는 모습보다 다른 누군가를 감싸고 품어 그 풍미를 더해주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까닭이다.
- 작가: KIRIMI/KiRiMi 일러스트레이터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삶 –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득 영감을 받아 무작정 기록해보는 진솔한 이야기.
- 본 글은 KIRIMI 작가님께서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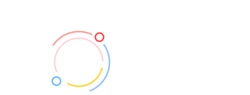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