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레스토랑 웨이터의 수난기
독일 레스토랑 웨이터의 수난기
한국에서 알바몬으로 산지 N년 간 나는 옷 가게 직원, 식당 직원, 카페 직원, 놀이공원 직원 등을 전진하면서 알바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었고 새로운 분야의 알바를 시도하더라도 불안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자신 있던 나는 독일 식당으로 출근한지 이틀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생소한 언어, 이국적인 음식, 다른 식사 문화 등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했던 식당은 스페인 음식을 파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오는 손님의 연령대도 20대보다 40-50대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음료 종류만 156 가지나 됐기에 식사 후 2차를 위해 온 손님들도 있었다. 음식의 가격 또한 꽤 나가는 편이라 학생 신분에는 쉬이 갈 수 없기에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어 줄 때만 맛볼 수 있었다. 또한 단골손님이 많아 손님과 매니저 관계가 마치 친구와 같이 서로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나는 실수하고 또 실수했다. 그것은 아마 독일어뿐 아니라 독일 식당 문화에 미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 서빙하던 때의 경험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때는 눈짓을 보고 다가갈 필요도 없었고 그릇도 손님이 다 먹고 자리에 일어나면 그때 치우면 될 뿐이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릇이 쌓이지 않게 치워주는 것이 식당 문화였다. 음료수 잔이 빌 때마다 리필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했으며 눈이 마주치면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식사는 입에 맞는지 물어봐야 하는 등 식사를 하는 손님에게 눈을 떼면 안 됐다. 식기를 그릇 위에 올려놓았다는 시그널은 식사의 끝을 의미하는지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았다. 그래서 단체 손님의 그릇을 치우다가 식사가 끝나지 않았던 손님의 그릇도 치워 손님의 황당한 얼굴을 본 적도 있었다.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
한국이랑 식사 시스템도 달랐다.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리로 안내해야 했다. 식사 후 계산을 위해 웨이터가 직접 테이블로 가야 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개인으로 왔든 단체로 왔든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손님이 무엇을 시켰는지 항상 머리릿속에 담아둬야 했다. 그래서 각자 계산할 때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리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면 한 명이 계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내주는 한국의 더치페이 시스템이 무척 그리우기도 했다.
식사 문화도 달랐다. 한국에서 레스토랑은 밥을 먹기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당은 지인과 만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강했다. 그들은 3,4시간은 거뜬히 앉아 식사 후 대화를 나눴고 그러면서 디저트를 먹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또한 음식을 시킬 때 거의 매번 술을 같이 시키는 것은 초반에는 어쩐지 익숙하지 않기도 했다. 그들은 살짝 기름진 음식과 드라이한 와인의 조합을 사랑했으며 단백한 고기와 어울리는 청량감 넘치는 맥주도 사랑했으며 도수가 진한 위스키도 사랑했다. 식전 주, 식후 주라는 개념도 이 식당에서 알게 되었다. 술의 종류 특히 와인의 종류를 색깔로 밖에 구분하지 못했던 내가 와인 맛을 조금씩 느끼고 언젠가부터 코르크 마개를 잘 따기 시작했다면 그건 아마 독일 식당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점이 아니였을까 생각한다.
독일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외에도 인간관계 라던지 사소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때가 없었으면 다음 알바자리에서 혹은 레스토랑은 방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독일 살면서 또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독일 식당 문화 혹은 술을 항상 곁들이는 식사 문화에 무엇보다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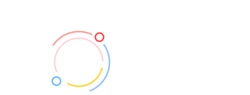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0